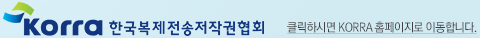그래도 교육자들에게는 저작권법 25조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도 이 저작권 제한규정을 늘 고맙게 여긴다. 교육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권리자의 무지막지한 통제에서 보호하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황순원 선생의 국민소설 ‘소나기’를 마음대로 읽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라!

손 수 호 교수
(인덕대 교수,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더욱이 초·중·고 교단에서는 25조가 복음이나 마찬가지다. 수업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작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돈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용형태도 복제에서 전송까지 넓다. 이 얼마나 튼실한 우산인가.
다만 무대가 대학으로 옮겨가거나 직접적인 수업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르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절충을 했다고나 할까. 대표적인 것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저작물 이용이다. 교육청과 같은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의 절차는 생략하되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그동안 사문화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도입 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적 판단을 한 끝에 고시(告示)를 미뤄온 결과다. 여기에다 비슷한 성격의 수업목적보상금이 대학과 다툼을 벌이면서 예상 밖으로 오랜 기간을 거치는 바람에 아우격인 수업지원목적보상금도 덩달아 순연되고 말았다. 다행히 수업목적보상금이 극적인 합의에 이르러 시행에 들어가자 문체부가 다음 수순으로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어 죽어있는 법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 규정이 도입됐으니 무려 5년 만의 일이다.
저작권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해왔다. 보상금액의 기준을 연구한 데 이어 당사자격인 교육청 쪽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 올해 들어 3월과 4월에 잇달아 교육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수업목적보상금제도 도입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제도도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내지 않던 돈을 내야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다. 실제로 교육청 등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차원을 넘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지원기관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저작물을 떳떳하게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 책임 있는 교육기관의 온당한 자세 아니겠는가. 문체부도 고시를 서둘러야 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다.
더욱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672만 명에 이르는 초중고생이다. 우리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어문저작물을 비롯해 이미지나 음악, 영상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수준 높은 콘텐츠가 공급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보상금 수령과 분배를 맡은 단체도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