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십대 중반을 삼척에서 지내게 되자 죽서루는 내 삶의 위안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었다. 영동 지역에서 자란 나에게 관동팔경의 명성은 늘 경포대를 통해서 각인되었기 때문에, 죽서루는 늘 관동팔경의 여러 장소 중의 한 곳으로만 인식되었다. 나는 죽서루를 사진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접했다. 지금과는 달리 교통이 여의치 않던 시절이었으므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죽서루를 가보기 어려웠던 탓도 있었으리라.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삼척에서 지내게 되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삼척 생활을 하게 되자 삶이 팍팍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직장에서 한 사람 몫을 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때까지의 자유로운 삶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일에 지친 직장인으로 꼼짝없이 살아가게 되었다. 순식간에 그 편차가 만들어지니 나로서도 적응하기가 혹은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 숨 막힐 듯 조여드는 생활을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일종의 숨터 같은 공간이 필요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숨터가 바로 죽서루였다. 막 여름이 도시 안으로 들어올 무렵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잠시 틈을 내서 죽서루를 들렀다. 평일 한낮의 죽서루는 너무도 고즈넉했다. 누정에 오르니 절벽 아래로 흘러가는 오십천 맑은 물이 초여름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건너편 연초록 숲이 제법 짙푸른 녹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지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때 어디선가 시조창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장한 가락에 얹어서 세상 시름을 보내니 죽서루야말로 신선세계가 따로 없었다. 내가 처음으로 시조창을 배운 곳도 죽서루 한켠에 있던 노인정이었으니, 내게는 젊은 날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다. 지금은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죽서루는 원래 삼척도호부 부속 건물 중의 하나였다. 워낙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발길을 머무르게 했었다.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 꼽혔지만 어느 곳 못지않게 아름다운 풍광과 그 나름의 특장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죽서루였다. 사람들은 이곳에 올라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람살이의 기쁨과 슬픔을 노래했다. 관아에 달린 정자 였으므로 삼척을 지나는 관리들을 물론 길을 떠난 양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다. 풍광이 좋은 곳에 정자를 세웠던 것이야 예로부터 상례로 있었지만, 그 유래를 따져보면 죽서루는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동팔경의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죽서루만의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서 많은 관료 문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허목(許穆, 1595~1682)은 한때 삼척부사를 지낸 적이 있는 관료문인이다. 그가 남긴 「죽서루기(竹西樓記)」(『기언記言』 권13)에서는 다른 경관에 비해 죽서루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서술하였다. 관동팔경은 모두 바다와 연접하여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비해 죽서루만은 바다와 관계없이 오십천을 끼고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바, 허목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변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든 아니면 큰 못이 있든 그들은 모두 바다와의 관련을 벗어나지 않는 경관이었다. 그러나 죽서루만은 강물이 감돌아 흐르는 물가 바위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죽서루에 힘찬 필치로 ‘제일계정(第一溪亭)’이라는 현판이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여타의 관동팔경과는 달리 오십천을 끼고 수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한 특징을 담아 ‘관동제일루(關東第一樓)’라는 현판을 걸 만하지 않은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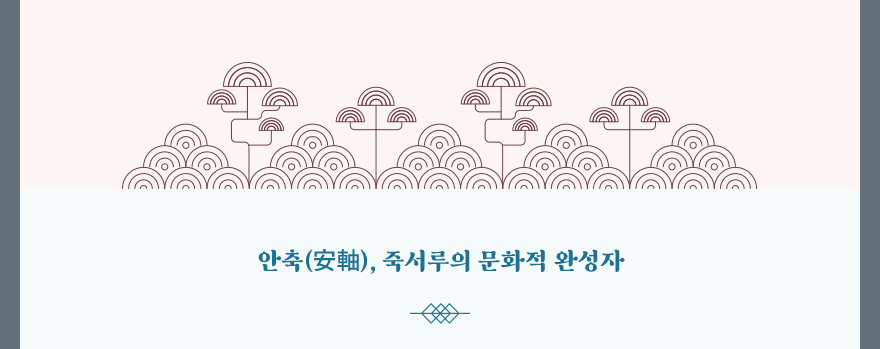 |
|
명승으로서의 죽서루를 완성시킨 사람은 고려 후기 관료 문인 안축이다. 그가 기록한 죽서팔경은 훗날 많은 문인들에 의해 애송되면서 차운시의 소재가 되었다. 특히 고려 시대에만 해도 이곡, 이달충(李達衷, 1309~1384) 이 연이어서 차운한 것을 보면 죽서팔경은 지식인 그룹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축의 죽서팔경을 차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죽장고사(竹藏古寺), 암공청담(巖控淸潭), 의산촌사(依山村舍), 와수목교 (臥水木橋), 우배목동(牛背牧童), 농두엽부(壟頭饁婦), 임류수어(臨流數魚), 격장호승(隔墻呼僧). 안축의 죽서팔경 중에서 작품 한 편을 읽어보자. 고려 후기 사대부로서의 생각을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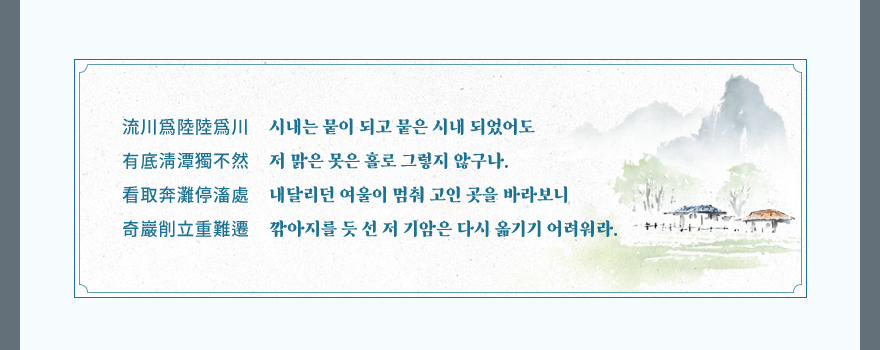 |
|
이 작품은 ‘바위가 끌어당긴 맑은 못’이라는 뜻의 ‘암공청담(巖控淸潭)’을 표제로 하여 지어진 것이다. 죽서루 아래 흐르는 오십천이 누정 아래 암벽을 치면서 휘어져 흐르는 곳에 맑은 물이 고인 곳이 있다. 오십천이 돌아나가는 공격사면 쪽 암벽 위에 죽서루가 건립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 물이 잠시 숨을 멈추어 못을 이룬다. 지금도 죽서루 아래쪽 암벽에 ‘응벽담(凝碧潭)’이라는 암각자가 남아있는데, 이곳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누정 아래로 보이는 못은 맑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뭍은 시내가 되고 시내는 물이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러나 유독 이 못만은 태고적 모습을 간직하며 그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뽐낸다. 이는 죽서루에서 내려 보이는 못의 풍경에 주목한 것인데, 안축의 죽서팔경에 들어있는 작품 중에서 자연 풍경을 노래하는 계열은 대체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이법(理法)의 현현(顯現)이라는 작자 자신의 생각이 스며있다. 고요한 못, 우뚝 선 기암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고요함이나 굳센 절의를 떠올리게 하는 수법은 유학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안축의 죽서팔경을 유학자의 시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안축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죽서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풍경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작자의 위치는 아마도 죽서루 위가 아니라 죽서루 건너편에서 바위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결구(結句)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위 절벽을 보면 이는 누정 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치가 죽서루라고 하는 하나의 경관 포인트를 상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죽서루를 돋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서루 주변의 풍경을 누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작자의 위치를 반드시 누정에 두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양한 시선으로 주변을 노래하지만 그러한 풍경들이 구성하는 최종 지점은 바로 죽서루였다. 이런 방식은 임류수어(臨流數魚)를 노래한 작품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이에 비해 죽장고사(竹藏古寺)와 격장호승(隔墻呼僧) 부분은 죽서루라는 공간에서 보이는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경치에 초점을 맞춘 네 편의 작품 중에서 두편은 죽서루에서, 두 편은 죽서루 밖에서 경치를 노래한 셈이다. 이 역시 명확하게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안축이 형상화하고 있는 죽서루의 풍경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선에 의해 하나의 이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탄생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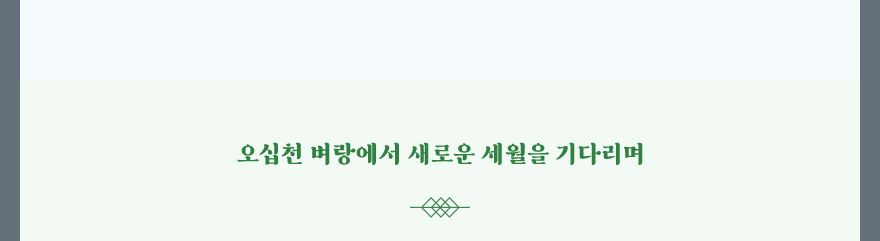 |
|
죽서루가 늘 지금의 모습대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불에 타기도 했고 그에 따라 중수하기도 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랜 것은 고려 명종 무렵에 활동했던 김극기(金克己, 생몰연대 미상)의 시다. 그의 작품에서도 죽서루는 관아의 부속 건물로 묘사되고 있어서, 애초에 이 건물의 형성이 관청과 관련되어 있었고 조선의 명운이 끝을 맺을 때까지도 그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죽서루가 적어도 고려 명종 이전에 건립되어 지식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이후 본격적인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 후기에 와서이다. 안축(安軸, 1282~1348)의 『관동와주(關東瓦注)』, 이곡(李穀, 1298~1351)의 「동유기(東遊記)」에 이미 죽서팔영(竹西八詠)을 언급한 이래 죽서루는 고려의 많은 문인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시의 소재로 알려져서 차운(次韻)되었다. 안축은 1330년(충숙17)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에 임명되어 동계(東界) 지역을 돌아본다. 위로는 함경도 남쪽에서부터 아래로는 울진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을 따라 자신의 관할지를 돌아보는 도중에 삼척 죽서루에 들른다. 그의 죽서팔영은 바로 이 때 지어진다. 이후 죽서팔영은 여러 관료 문인들에 의해 차운(次韻)되어 하나의 계열을 이룰 정도로 여러 편이 창작되었다. 죽서팔영은 기록에 따라 삼척팔영(三陟八詠), 삼척서루팔영(三陟西樓八詠), 서촌 팔경(西村八景)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고려의 이름난 관료문인들이 죽서루를 방문하고 시문을 남겼지만, 건물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대체로 1403년(태종3) 삼척부사를 지낸 김효손(金孝孫, 1373~1429)이 죽서루의 옛 터에 건물을 지었고 1425년(세종3) 삼척부사 조관(趙貫)이 단청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보건대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건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지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후 증수와 개축, 조경 등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그 나름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뎌온 죽서루는 그것이 겪었던 굴곡만큼이나 다양한 내용의 시문을 탄생시켰다. 근대 이전에 창작된 죽서루 관련 시문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진주지(眞珠誌)』 『관동지 (關東誌)』 『강원도지(江原道誌)』 등과 같은 지방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지, 개인 문집 등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죽서루가 시대를 넘어가면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죽서루는 많은 사람들의 숨터로, 혹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천년세월을 이겨낼 것이다 |

|
| 메일 수신을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 주십시오. To unsubscribe click 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