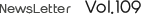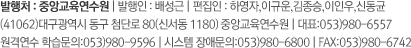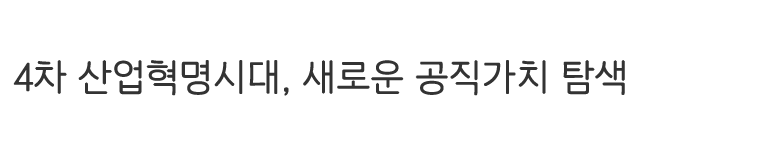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졌다. 매년 솔깃하게 하는 시대적 유행어를 만드는 포럼의 승부사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아마도 “Concept”와 “Design Thinking” 발굴의 귀재처럼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속성은 정보통신 기술을 넘어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연결된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의 “섬뜩한 진화”로 상징되는 알파고가 인간 두뇌를 넘어섰다고 아우성이다.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인류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일자리가 생겨나는 속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못 쫓아가서 일자리가 파괴되어 실직을 당할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든다. 4차 산업혁명이 몰아치면서 앞으로 5년간 일자리 7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우울한 전망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210만 개 만들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약 5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고용 쇼크가 이처럼 빨리, 대규모로 불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은 충격적이다. 이에 대비하여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 학교도 덩치가 큰 물고기보다 빠른 물고기가 되어야 한다는 슈바프 회장의 충고가 심상치 않다. 이제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생존하는 전략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여야 한다.
스위스 금융그룹(USB)이 발표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순위에서 한국을 25위로 평가했다. USB는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가중평균해서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39개국 가운데 83위에 그쳐 전체 순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됐다. 기술 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SOC(20위) 등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서 앞서 뛰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노동구조도 유연하게 재설정해야 하는 등 갈 길이 급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성되고 변화할 직무역량을 파악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지식전달 중심의 폐쇄형 교과서(text) 위주가 아닌, 변화에 대응하고 소통하는 개방형의 살아있는 교육(alive education)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 충격으로 국민 생활이 고달파지고 불안할 때, 공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공직가치와 공무원 역량은 무엇일까? 쉽지 않은 과제다. 하나의 실마리로서 연결형 행정 서비스와 적극적 행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 목적지까지 편하게 데려다주는 “공직자의 코치 역할”을 생각해본다.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규범에 대한 논의로서 공직가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공직가치인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내리기 쉽지 않다. 정부 또는 공직이 달성해야 하는 가치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직가치는 공직(public sector, 公職)과 가치(value, 價値)가 합해진 표현이다. 공직은 가치가 준수되는 공간적 영역(domain)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공직가치(public sector value)는 “정부의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녀야 할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관, 공직관, 윤리의식과 청렴 등 방대한 분야를 아우른다. 공무원의 업무 자세와 생각하는 방식에서 작용하는 마음가짐, 봉사, 성품, 지식, 기술, 역량이 공직가치라는 큰 나무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한편 2016년 9월 30일부터 공포·발효되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었다. 이 법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로 가야 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중 하나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세계적 청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6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순위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37위에 그쳤다. 지난 10년 동안 순위는 37위~40위를 기록하는 Box 횡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앞서 2007년에 발표된 세계은행(World Bank)보고서에 의하면 한 나라의 부(富)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한 바 있다. OECD 선진국은 100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 81%, 생산자본 17%, 천연자본이 2%를 차지한다고 한다. 주요국 사회적 자본지수 비교에서 한국은 평균 5.07에 불과한 29위로 OECD 최하위권이다. 이는 OECD 평균 5.80, G7 국가 평균 5.84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속, 사회적 품위, 사회규범, 신뢰, 反 不正腐敗, 법질서, 노사관계, 기업윤리, 도덕성 등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을 키우지 않고는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인사혁신처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최고의 엘리트, 똑똑한 인재가 공직에 입문한다.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어떻게 해서든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한다.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이 있다고 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첫째, 국민의 눈에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둘째,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청렴과 윤리의식, 전문성이 부족하다. 셋째, 정부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보면 사회 문제에 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 해결 능력, 위기관리에 미숙하다. 넷째, 요즘 정부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보면, 못 한다. 무능하다는 것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는 급변하는데 공직 사회는 지체되고 있다는 여론의 전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공무원들끼리만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플랫폼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선도형 공직가치로 무장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제까지의 공직가치와 청렴 교육은 공무원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알짜배기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정신교육을 한다는 거야. 그런 것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많았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니까 개인 성과관리에 교육이수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중 몇 시간은 듣고 거쳐 가야 하는 의무교육 성격이 강했다. 요즘 공무원 교육에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감을 주는 교육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공직가치는 주입식이며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의 직급(직무)별 개인역량, 기본역량, 관리역량, 조직역량, 전문역량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지 언제 공직가치 교육에 신경 쓸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가치는 모든 공직자가 업무수행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량 교육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공직가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공직역량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외면적 가치도 있고, 내면적 가치도 있다. 돈, 권력, 권한, 권위, 향락 등의 외면적 가치(external value)는 좁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일 수 있다. 인격, 자유, 평화, 생명, 도덕, 윤리, 사랑, 우정, 양심 등 내면적 가치(internal value)가 더 길고 오래가며 확산할 수 있다. 내면적 가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이 가능하고, 설계만 잘하면 총량을 늘릴 수 있다.
공직가치는 내면적 가치에 가깝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가치일수록 서열이 높다. 公職者는 개인 우선이 아닌 국민,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서비스 산업의 전파자이다.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공직가치 교육 없나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오래전(1970년대 중반)에 만든 국가(지방)공무원의 理念을 담은 근엄한 標石, “내 一生 祖國과 民族을 爲하여” 이 말은 지금처럼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공무원 세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내 일생 수명이 길게 가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내 일생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하여”, “내 일생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위하여”, “내 일생 공직에서 성공하는 정년을 위하여”는 어떨까? 다른 시각에서 이제 “위하여” 보다는 “함께”가 더 와 닿는다는 생각이다. “내 幸福 祖國과 民族과 함께”는 어떨까? “내 일생 행복교육 실현과 함께”, 낯간지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더 현실성을 띠는 “내 일생 연금과 함께” 도 호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지능 정보화 사회의 개념이 잡힐 듯 잘 안 잡히는 시점에서 공무원 교육의 모습은 사회의 모습을 담아낸다. 미래에 요구되는 공무원 인재상과 공직역량을 공직가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공직가치를 위해 검토해 볼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혁신과 행정의 변화를 간파하여 통합하는 행정가 정신 함양 둘째, 국민(시민고객)의 필요, 아픔, 기호, 정서를 파악하는 감수성(sensitivity) 배양. 셋째, 직업공무원으로서 자긍심, 열정, 공익정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향상.
새로운 공무원상과 공직가치가 필요한 지금, 공무원은 국민, 즉 정책소비자(policy consumer)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생산물)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공무원의 존재감(presence)은 국가와 사회 문제 상황에서 민첩하며 반응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때 더욱 발휘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지진해일이 밀려오는 시대, 역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을 깨우는 “자연지능”에 관해 성찰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로봇화, 자동화의 길을 걷더라도 자연, 생명, 사물과의 교감, 그리고 인간애(humanity)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글을 맺는다.
스위스 금융그룹(USB)이 발표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순위에서 한국을 25위로 평가했다. USB는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를 가중평균해서 점수를 산출했다.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139개국 가운데 83위에 그쳐 전체 순위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분석됐다. 기술 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SOC(20위) 등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에서 앞서 뛰고 있는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교육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노동구조도 유연하게 재설정해야 하는 등 갈 길이 급하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성되고 변화할 직무역량을 파악해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지식전달 중심의 폐쇄형 교과서(text) 위주가 아닌, 변화에 대응하고 소통하는 개방형의 살아있는 교육(alive education)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 충격으로 국민 생활이 고달파지고 불안할 때, 공직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시원하게 해답을 주는 공직가치와 공무원 역량은 무엇일까? 쉽지 않은 과제다. 하나의 실마리로서 연결형 행정 서비스와 적극적 행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 목적지까지 편하게 데려다주는 “공직자의 코치 역할”을 생각해본다.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 규범에 대한 논의로서 공직가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공직가치인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내리기 쉽지 않다. 정부 또는 공직이 달성해야 하는 가치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직가치는 공직(public sector, 公職)과 가치(value, 價値)가 합해진 표현이다. 공직은 가치가 준수되는 공간적 영역(domain)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공직가치(public sector value)는 “정부의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녀야 할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관, 공직관, 윤리의식과 청렴 등 방대한 분야를 아우른다. 공무원의 업무 자세와 생각하는 방식에서 작용하는 마음가짐, 봉사, 성품, 지식, 기술, 역량이 공직가치라는 큰 나무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한편 2016년 9월 30일부터 공포·발효되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화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었다. 이 법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로 가야 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중 하나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세계적 청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6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순위에서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37위에 그쳤다. 지난 10년 동안 순위는 37위~40위를 기록하는 Box 횡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에 앞서 2007년에 발표된 세계은행(World Bank)보고서에 의하면 한 나라의 부(富)는 법질서와 신뢰, 지식경쟁력 등 「사회적 자본」에서 나온다고 진단한 바 있다. OECD 선진국은 100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 81%, 생산자본 17%, 천연자본이 2%를 차지한다고 한다. 주요국 사회적 자본지수 비교에서 한국은 평균 5.07에 불과한 29위로 OECD 최하위권이다. 이는 OECD 평균 5.80, G7 국가 평균 5.84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속, 사회적 품위, 사회규범, 신뢰, 反 不正腐敗, 법질서, 노사관계, 기업윤리, 도덕성 등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을 키우지 않고는 선진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인사혁신처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에 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인 면은 최고의 엘리트, 똑똑한 인재가 공직에 입문한다.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어떻게 해서든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한다.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이 있다고 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첫째, 국민의 눈에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둘째,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청렴과 윤리의식, 전문성이 부족하다. 셋째, 정부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보면 사회 문제에 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 해결 능력, 위기관리에 미숙하다. 넷째, 요즘 정부와 공무원이 하는 일을 보면, 못 한다. 무능하다는 것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사회는 급변하는데 공직 사회는 지체되고 있다는 여론의 전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공무원들끼리만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플랫폼으로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선도형 공직가치로 무장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제까지의 공직가치와 청렴 교육은 공무원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알짜배기 교육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정신교육을 한다는 거야. 그런 것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많았다. 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니까 개인 성과관리에 교육이수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중 몇 시간은 듣고 거쳐 가야 하는 의무교육 성격이 강했다. 요즘 공무원 교육에도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감을 주는 교육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공직가치는 주입식이며 고리타분하다고 치부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의 직급(직무)별 개인역량, 기본역량, 관리역량, 조직역량, 전문역량을 높이는 일이 우선이지 언제 공직가치 교육에 신경 쓸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가치는 모든 공직자가 업무수행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역량 교육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공직가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공직역량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외면적 가치도 있고, 내면적 가치도 있다. 돈, 권력, 권한, 권위, 향락 등의 외면적 가치(external value)는 좁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일 수 있다. 인격, 자유, 평화, 생명, 도덕, 윤리, 사랑, 우정, 양심 등 내면적 가치(internal value)가 더 길고 오래가며 확산할 수 있다. 내면적 가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이 가능하고, 설계만 잘하면 총량을 늘릴 수 있다.
공직가치는 내면적 가치에 가깝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가치일수록 서열이 높다. 公職者는 개인 우선이 아닌 국민,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서비스 산업의 전파자이다.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속 있는 공직가치 교육 없나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오래전(1970년대 중반)에 만든 국가(지방)공무원의 理念을 담은 근엄한 標石, “내 一生 祖國과 民族을 爲하여” 이 말은 지금처럼 다양한 개성을 가진 공무원 세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대신 “내 일생 수명이 길게 가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내 일생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하여”, “내 일생 가족의 행복과 사랑을 위하여”, “내 일생 공직에서 성공하는 정년을 위하여”는 어떨까? 다른 시각에서 이제 “위하여” 보다는 “함께”가 더 와 닿는다는 생각이다. “내 幸福 祖國과 民族과 함께”는 어떨까? “내 일생 행복교육 실현과 함께”, 낯간지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더 현실성을 띠는 “내 일생 연금과 함께” 도 호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지능 정보화 사회의 개념이 잡힐 듯 잘 안 잡히는 시점에서 공무원 교육의 모습은 사회의 모습을 담아낸다. 미래에 요구되는 공무원 인재상과 공직역량을 공직가치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공직가치를 위해 검토해 볼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서 기술혁신과 행정의 변화를 간파하여 통합하는 행정가 정신 함양 둘째, 국민(시민고객)의 필요, 아픔, 기호, 정서를 파악하는 감수성(sensitivity) 배양. 셋째, 직업공무원으로서 자긍심, 열정, 공익정신,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향상.
새로운 공무원상과 공직가치가 필요한 지금, 공무원은 국민, 즉 정책소비자(policy consumer)의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생산물)를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한다.
공무원의 존재감(presence)은 국가와 사회 문제 상황에서 민첩하며 반응하고 책임지는 행동을 할 때 더욱 발휘된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지진해일이 밀려오는 시대, 역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을 깨우는 “자연지능”에 관해 성찰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로봇화, 자동화의 길을 걷더라도 자연, 생명, 사물과의 교감, 그리고 인간애(humanity)는 잃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글을 맺는다.